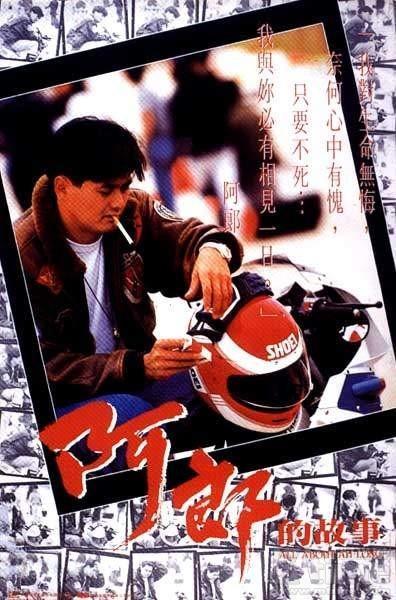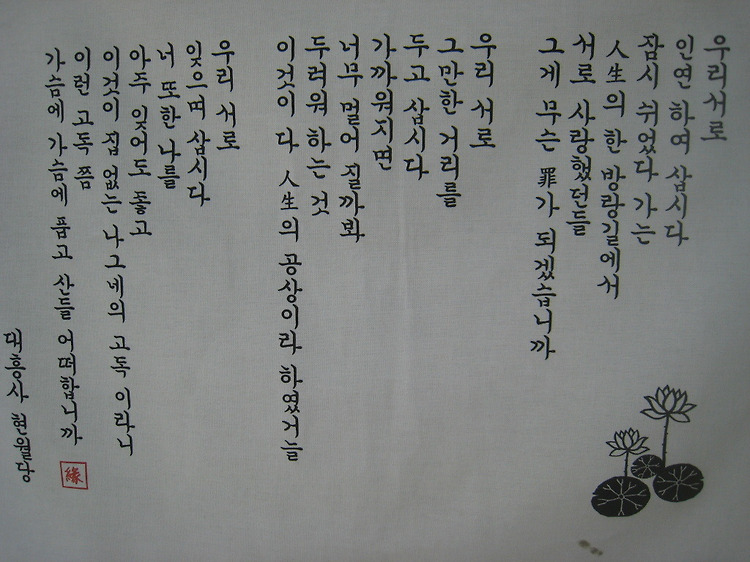사람이 동성이든, 이성이든지간에... 내가 좋아한다, 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터이다. 나 역시도 그렇다, 어느 날 하루 생각치도 않게 후배넘 전화를 받고 나가 그 후배넘이 무슨 문제가 있네... 하면서 솔직담백한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진지하게 얘기를 듣게되며 또한 '나에게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...'라며 그런 얘기까지 하는 그 후배의 하소연을 '믿음'으로까지 승화시켜버린다. 뭐, 당연히 얇은 지갑에서 살포시 만원짜리 몇장을 꺼내 술값을 내게되고... 그러면서 후배에게는 '괜찮을꺼야.'라고 말은 해주지만, 사실 그러는 동안 '내일부터 또 얼마나 굶어야 하는가...' -_-; 부터 걱정을 하게 된다. 없는 살림에 꼴에 선배랍시고 술값을 내긴 하지만, 그래도 내 능력 이상의..